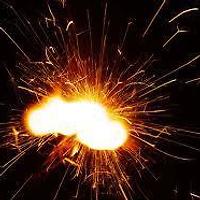아버지와 자전거
초등학교 시절 아동용 자전거를 갓 졸업했던 나는 큰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21단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다. 당시 21단 자전거는 우리 세대의 핫 아이템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최고사양으로는 무려 27단까지 변속이 가능한 자전거가 있다고 들었으나 확인된 바는 없었다.
크리스마스도 가까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대번 "그러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신이 나서 21단을 살꺼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자전거가 오면 한번 타보자는, 그런 턱없는 부탁하던 녀석들도 있었다. 그 친구가 하도 애원을 하기에 결국 M-16 비비탄 총 일주일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한 번 타보자는 '쇼부'를 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3일 후에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서 환한 미소로 "문수야 밖에 나와봐"라고 하셨다.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신발도 신지 않고 튀어나갔다. 현관머리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은색 광택이 번쩍번쩍한 새자전거였다. 너무도 신난 나는 팔짝팔짝 뛰며 '아빠, 이거 21단 맞지? 21단 맞지?'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21단을 잘 모르셨나보다. 짐짓 당황하시더니 그때서야 뒷바퀴 기어 단수를 세보시는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끝이었다. 21단보다 뒷 바퀴 기어가 하나 모자란 18단 자전거. 딱 하나가 모자랐을 뿐인데 21단과 18단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여의주를 물고 999일을 기다린 이무기와 승천하는 용처럼 확연하고 처연한 격차였다. '우리집이 21단이 아닌 18단을 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가.'라는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다. 어디 그뿐인가. 이제껏 자랑질을 하고 다닌 내 위신은 뭐가 된단 말이냐. 나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엉엉 울었다. 당황한 아버지가 18단도 잘 나간다고 한번 타보라고 그렇게 어루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어릴적 나는 욕심도 많고 성격도 괄괄해서 한 번 눈물을 흘리면 울음을 그칠 명분이 생길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30분 정도를 자전거 앞에서 장례식이라도 치를 것처럼 울었나. 어버지가 그렇게 권유를 하니 한번 타본다는 식으로 자전거 안장에 앉았다. 사실 그것도 그냥 탄 것이 아니라 타지 않겠다는 걸 아버지가 나를 번쩍 들어 자전거 안장에 앉혔던 것 같다.
그렇게 엉엉 우는 시늉을 하면서 자전거를 잡고 조금씩 페달을 밟았다. 겉으로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어물어물 달렸지만, 사실 다들 알다시피 18단이나 21단이나 쌩쌩 잘만 나가는 건 매한가지였다. 마음 속으로는 '그래도 18단이니 어디냐. 아쉬운 감은 있지만 선방했다'고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누그러진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처음 타보는 26인치 성인용 자전거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고작 18단이라고 생각했던 기어도 얼마나 신통방통 잘 움직이던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빙빙 돌았다. 그렇게 나는 30분 정도를 달렸다가 아버지와 함께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날부터 나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녔다.
그 자전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도둑님이 말도 없이 인수해 가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2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더 좋은 선물을 달라고 징징짜며 설레발 치던, 남의 자식 같으면 한 대 줘박고 싶은 아들을 보며 선물을 내밀고도 무색해하던 아버지의 표정이 떠오르면 지금도 코 끝이 찡하다. 그때가 아마 지금처럼 길 한편에 눈덩이가 쌓여있는 겨울이어서 더 그런지도 모른다.